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높은 관세·서비스 부문 제한” 원인과 대응 논의
톨로스 재단 국제 무역장벽지수 발표, 122개국 중 최하위…
정부는 “비관세장벽 적어 국내 산업 보호 미흡” 반론 제기
무역장벽 세계 최악, 인도네시아 122위… 홍콩·싱가포르와 대조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톨로스 재단(Tholos Foundation)이 발표한 ‘2025년 국제 무역장벽지수(Trade Barrier Index, 이하 TB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조사 대상 122개국 중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국가로 선정됐다.
TBI는 전 세계 GDP의 약 97%, 인구의 80%를 포함하는 국가들의 관세, 비관세장벽(NTB), 서비스 제한 등 직접 무역장벽과 물류 성과, 재산권 보호, 디지털 무역 제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간접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지수다.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총점은 5.84점(0~10점 척도, 낮을수록 무역장벽이 낮음)으로, 전체 122위에 해당한다.
항목별로는 ▲무역 관세 7.11점(109위) ▲서비스 부문 제한 8.15점(122위·최하위) ▲비관세장벽 2.1점(79위) ▲무역 원활화 6.0점(87위) 등으로, 특히 높은 관세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극심한 제한이 두드러졌다. 반면, 홍콩(1위), 싱가포르(2위), 이스라엘(3위), 캐나다(4위), 일본(5위) 등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무역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에서도 경쟁국인 싱가포르(2위), 말레이시아(36위), 라오스(91위), 필리핀(116위), 베트남(117위), 태국(118위)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 높은 관세와 서비스 부문 규제, 그리고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 무역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톨로스 재단은 이번 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기록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서비스업 진입 장벽으로 인해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관세 지수(7.11)는 인도(9.48), 이집트(8.36) 등 일부 저소득 국가와 유사할 정도로 매우 높다.
특히 서비스 부문 점수(8.15)는 122개국 중 유일하게 8점을 넘는 수치로,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금융, 통신, 유통, 해운, 교육 등 핵심 서비스 시장 진입이 극도로 제한된 현실을 보여준다.
비관세장벽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산부품 의무화(TKDN)’ 정책 등 각종 규제가 대표적 NTB로 꼽힌다.
예를 들어, 대규모 글로벌 제조사가 현지 조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제품 출시가 막혀 최신 IT기기 등 일부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역정책은 ▲고율 관세 부과 ▲외국계 및 다국적 서비스 사업자 진입 제한 ▲엄격한 현지화 정책 및 인증 절차 ▲지연되는 배송, 취약한 물류 및 인프라 등이 결합되어 글로벌 무역 흐름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높은 무역장벽의 파급효과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과도한 무역장벽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①외국인 투자(FDI) 위축, ②국내 혁신 동력 저해, ③수출 경쟁력 약화, ④국내 시장의 상품·서비스 가격 부담 상승, ⑤공급망 취약화 등 복합적 부정효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특히 무역 디지털화, 글로벌 공급망 전환 등 세계경제가 ‘개방화+경쟁력 강화’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자국 시장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도 지적된다.
– 반론: “비관세장벽 오히려 너무 적어… 인도네시아 산업 보호 미흡”
이번 발표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5월 8일,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는 “비관세장벽(NTB)과 비관세조치(NTM) 수에서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실제로 국내 산업 보호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NTB와 NTM은 약 370건으로, 중국(2,800건), 인도(2,500건), 유럽연합(2,300건), 말레이시아·태국(1,000건 이상) 등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보호장치가 부족해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은 쉽지만, 우리 기업은 타국의 다양한 NTB·NTM에 막힌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내 허용 범위에서 NTB·NTM 확대 등 적절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리프 대변인은 “국내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관세장벽 등의 활용을 최적화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 대책 및 전망: 무역장벽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병행 필요
무역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존하는 고율관세, 서비스시장 폐쇄, 비관세장벽 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관세장벽의 투명화·합리화, FTA 추진 확대,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제도 현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 산업 보호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WTO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NTB·NTM 활용, ②산업별 지원정책 차별화, ③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첨단 산업 육성, ④시장진입·물류·통관 등 무역 인프라 현대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보호주의가 ‘혁신 저해’로 이어질 우려와 국제사회의 ‘공정무역’ 요구에 대응하는 균형 잡힌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 결론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장벽 문제는 단순한 규제 논란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투자 유치, 수출 확대, 그리고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골프] 태국 자라비 분찬트, 2026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역전 우승… 한국 김서윤2 공동 2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짜라위-분짠태국이-인도네시아-여자오픈총상금-60만달러에서-우승컵을-차지했다.-2026.2.1-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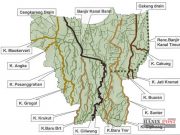










![[기획 연재5]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준비의 출발점은 원료와 공장 관리](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0/인싸이롭INSIGHTOF-Consulting-박단열-대표.-180x135.png)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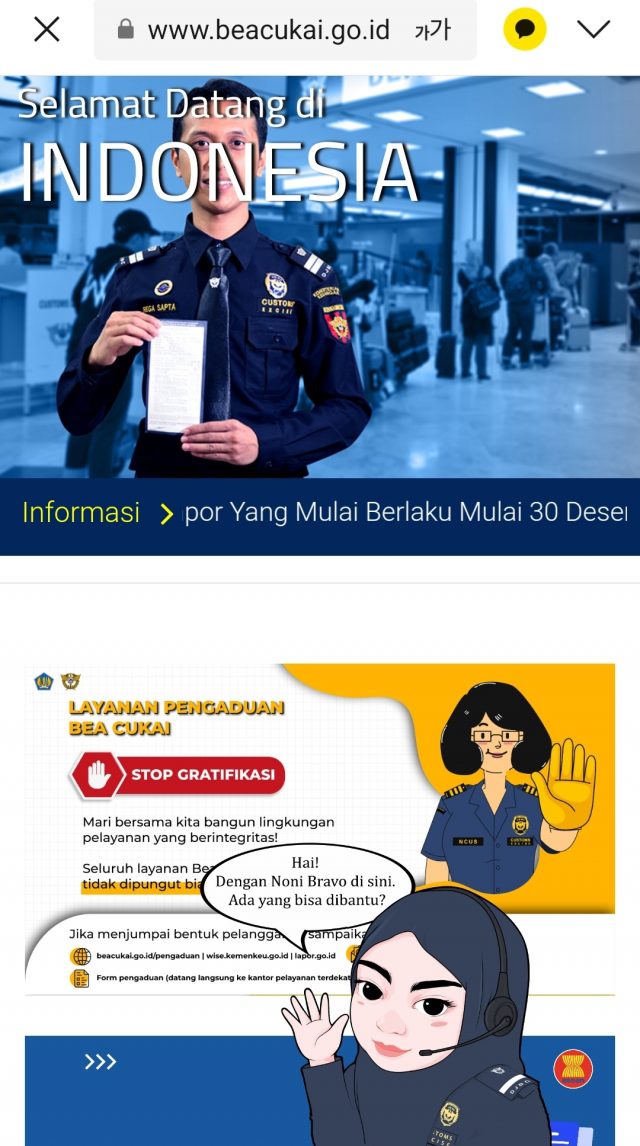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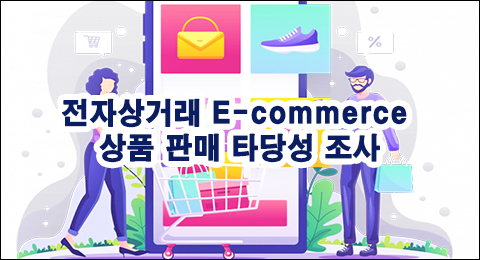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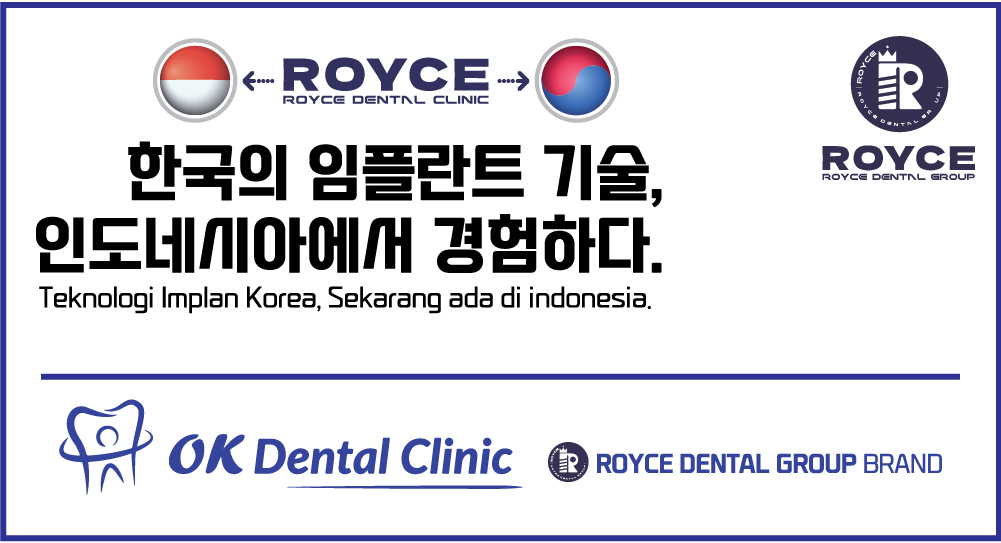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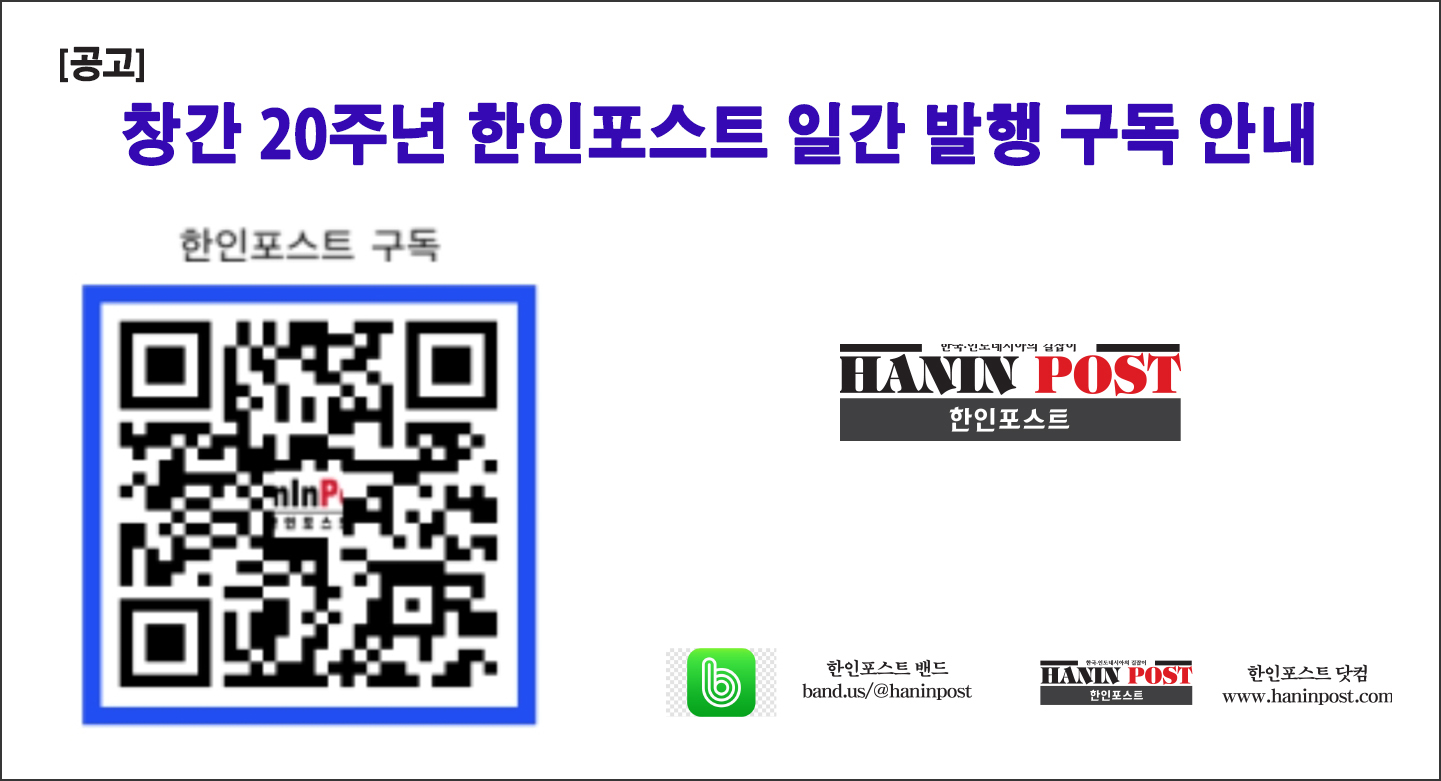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