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소감>
숨이 넘어갈 듯한 강풍과 땅을 파고 들어갈 듯한 빗줄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우기이지만 제게는 눈물조차 나지 않는 메마름이었고, 한 줌의 먹구름마저 허락지 않은 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흔 초반에 시작된 계절 여행이었지만 쉰을 넘어 이제는 고국에서의 아름다웠던 사계절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유배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건기와 우기의 사이도 아닌 건기만이 존재하는 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詩)라는 작은 우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였는지는 잘 기억나 지 않지만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릴지도 모를 빗방울이 너무도 그리웠나 봅니다. 수상소식을 알리는 짧은 문자는 제게 그토록 기다리던 우기의 시작이었으며 작은 우산의 한 켠을 적시는 꿈이었습니다. 이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씨앗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우산을 준비하도록 격려해 주신 주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대회를 준비하시고 꿈의 장을 펼쳐 주신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와 부족한 작품에 용기와 힘을 실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개인 약력>
이름 : 윤세귀(1970년생)
약력 : 現) PT. PSE Prima Sukses General Manager (7월근무예정)
수라바야 세종학당 현지교원 역임
PT.CHOEUN MEDICAL General Manager 근무
Untag Surabaya University 한국어 강사
Widya Mandala Catholic University 한국어 강사
동부자바 한인회 사무국장 역임
[시부문 당선 최우수작]
건기(乾期)와 우기(雨期) 사이
여름내 머물던 화상의 상처가 빈 들을 핥아먹은 날 선 바람에 적당한 긴장도 없이 슬픈 중력으로 가라앉으면 시월 사각(死角)의 선에 걸어 둔 흐릿한 입김이 흙바닥에 먼저 누운 무덤을 찾아 채비도 없이 떠난 억울한 유배인의 비석을 기어이 파내 한 줌 시무룩한 비구름으로 등을 적신다. 습관에서 출발한 균열이 눈을 떠도, 또는 눈을 감아도, 한 평의 그늘조차 허락받지 못해 불편한 복판을 사연도 없이 가로지른다.
누군가 뱉어버린 볕의 흔적과 미처 담지 못한 별의 기다림이 이것과 그것 사이를 오가다 불쾌한 잿빛 청구서로 빈 하늘 저편 에 토해낸 정오의 임종을 지키며 젖어오는 가장자리부터 보상도 없이 임시 저장을 시작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말라붙은 그늘이 미련한 세월의 토악질을 양분으로 자라 진흙탕에서 시작한 비열한 담금질로 매일 단정하게 시들어가는 나를 베어 남겨진 어둠을 갈라 먹는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완벽한 균형은 없었다. 사실 시작과 끝도 생각만큼 이어지지도 않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이 분명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기에는 아픈 트리거였다. 가끔 알 수 없는 속임수로 예고도 없이 방문할 때조차, 선 새벽의 벼랑에서는 말라붙은 바람도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은 힘겹게 세워놓은 날 선 비탈의 달리기를 멈추고 건기와 우기를 번갈아 오가던 사이 어딘가에 기대 먼저 누운 별들이 미처 지키지 못한 임종을 보내며 흔해빠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할 것이다.
[심사평]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막 빠져나왔다. 적도의 작은 문학축제인 적도문학상도 3년을 쉬어야만 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문학을 끌어안고 우린, 살아남았다. 응모작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보였다. 최종심에서 살펴본 여섯 분의 작품들에서 그런 생명력이 느껴진다. 아쉽게도 후보작들은 대상을 낼 만큼 충분하다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으나 문학의 큰 씨앗이 태동하고 있음은 직감한다.
최우수상으로 윤세귀「건기와 우기사이」에는 이견이 없었다. 화자는 언제나 경계에 머무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시를 끌고 나가는 호흡이 장중하다. “매일 단정하게 시들어가는 나”는 결코 자조적이거나 회의적이지도 않다. 이미지를 다루는 솜씨 또한 노련하다. 시의 ‘담금질’로 단련된 시인의 문학인생을 기대 해 본다. <심사위원: 김준규(글), 김주명, 강인수>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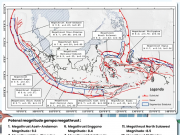
![[골프] 태국 자라비 분찬트, 2026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역전 우승… 한국 김서윤2 공동 2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짜라위-분짠태국이-인도네시아-여자오픈총상금-60만달러에서-우승컵을-차지했다.-2026.2.1-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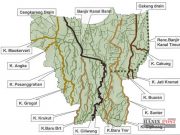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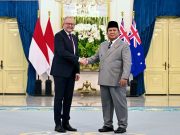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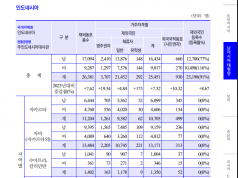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