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저녁으로 옮긴 명상 시간을 한 때는 아침에 가졌었다. 당시만 해도 저녁이면 술 한 잔 걸치고 귀가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아침 명상을 끝내고 아내가 간단한 아침 요기를 준비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이 그냥 허비(虛費)하기에는 너무 소중해 보이기에 책 한 단락 씩을 읽어보려고 시작했었다. ‘잭 컨필드’라는 명상가가 지은 ‘마음에서 이어지는 길 [A Path with Heart]’ 이라는 제목의 좋은 책이었다.
‘성공하는 리더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리더십 과정에서는 사명서 작성 시간에 간혹 명상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다.
과정진행을 하는 Facilitator 코치가 이끄는 대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누군가 가까운 지인(知人)이 돌아갔다 하여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장면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여러 친지, 동료, 후배, 가족 들과 고인(故人)에 대한 아쉬움, 사랑, 덕담 등을 나누고 차례를 기다려 관(棺)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 거기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 줄거리이다.
여러 사람들과 방금 나눈 망자(亡者)에 대한 찬사, 애도, 사랑, 그리움, 당신은 이것들을 부끄럼 없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남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 자신은 과연 돌아다보아 부끄럽지 않은 성취한 삶[fulfilled life]을 살았는가?
이러한 모의 사망 체험으로부터 삶의 여러 역할에 대한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좌표를 찾는 작업이 그 의도하는 바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읽은 책의 단락에서, ‘잭 컨필드’는 쉽고 그러나 더 준엄한 명상 제목을 제시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자신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도달했다고 가상(假想)하라는 것이다. 그 명상 속에서 이제까지 지내온 일생을 펼쳐 놓고 자신이 한 행위 중에 ‘두 가지 선행(善行)’을 기억 속에서 꺼내어 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 경우는 쉽지 않았다. 이력서에 써지는 굵직굵직한 일들은 일단 첫 번째 자격 심사에서 탈락되고 만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이로 어렵게, 두 가지 아주 사소한 일들이 떠올랐다. 그 작은 일들의 속성이 바로 ‘마음과 이어져 있는 일’이었음을 알았다. 무주상(無住相), 상(相)에 머무르지 않고 선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친절하지만 아주 준열(峻烈)한 방법이다.
그러고 보니 ‘무주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한 편 있었다.
80년대 후반 물불 모르고 일에 몰입할 때의 일이다. 눈물겹게 이루어 놓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고생한 팀원들과 함께 기리고 싶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공을 차지하고 정작 우리에게는 아는 체도 않자 어린 소견에 앙앙불락 했었다. 그 분을 삭이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얻은 어렴풋한 깨달음에 대해 쓴 글이었는데, 너무 큰 제목을 붙여 무거웠었다. ‘엔지니어’라는 저널에 실렸던 20년 넘게 묵은 글을 아래에 거두절미하여 인용해 본다.
[前略]
우리 아이들은 나더러 울보란다.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도 어른으로서는 창피한 일인데 TV 뉴스를 보다가도, 심지어는 만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글썽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초 육군 졸병 생활을 하면서도 그 무서운 빳다를 맞고는 울지 않았다는 것이 내 항변이다. 아내는 나더러 당신이 무슨 ‘엔지니어’냐고 한다. 허기야 두꺼비 집은 신방과 나온 우리 큰 딸이 고치고, 전기 다리미는 러시아어 전공의 막내딸이 고친다. 이 놈들이 다 시집가고 나면 할 수 없지. 아마도 불문과 나온 우리 할멈이 고쳐줘야 할 것이다.
‘방향족 제조시설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로서 나를 두 번 울게 한 프로젝트였다. 미국 본사의 방침이라는 구실로 사업계획이 연례행사처럼 반려되어 오던 유공(油公)의 Gulf 합작경영시절, 빤히 반려될 계획을 오뚝이처럼 매년 되 제출하던 우리들도 오기(傲氣) 덩어리였다. 회사의 경영주체가 SK로 바뀌고 1981년 이 사업이 이사회에서 새 경영진의 첫 사업으로 승인되던 날, 사업타당성 보고를 마치고 입안자(立案者)의 자격으로 배석했던 나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었다. 첫 번째 눈물. 성취감 속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설의 개념설계, 기술선(先) 선정, 투자지출예산 확보 등을 완결하고, 일을 프로젝트 집행 부서로 옮긴 후 팀장이던 나를 위시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추진팀 구성원들은 흩어져 각기 평상의 업무로 돌아갔다.
세월은 흘러서 1985년 초 공장이 준공되자 성대한 준공식이 열리고, 인물 좋은 돼지를 골라 고사도 지내게 되었다. 높으신 어른들이 모두 돼지머리에 절하고 마침내 공식 고사행사가 끝난 뒤, 나는 행사에 초대받지도 표창 받지도 못한 옛 프로젝트 팀원들을 모아 번외(番外) 고사를 지냈었다. 이번에는 눈물을 겉으로 비치지는 않았었다. 다소 공허하게 웃었던 것 같으나 실은 눈물이었다고 할 밖에. 젊었으므로 이 날의 경험을 삭이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이 해프닝은 내게 큰 마음 공부가 되었다. 우화(寓話) 한 토막.
어느 눈 온 날 새벽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는 등산객을 마주치게 된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지. 그러나 발 밑이 바쁜 상대방은 답례가 없다. 괘씸한 마음이 일어난다. ‘아침부터 남의 인사를 잘라 먹어?’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웃으며 길 옆의 소나무를 보고 절했다. 한번, 두 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답례가 없어도 소나무가 괘씸하지 않다.
일과 나, 그 ‘상에 머무르지 않는’ 관계의 발견이다.
[後略]
이재 배송도(怡齋 拜松圖)라는 화제(畵題)가 써진, 낙관도 표구도 하지 않은 두루마리 그림을 가끔 펼쳐 보던 때를 기억하며 다소 추억에 젖어 이 글을 쓴다.
이재(怡齋)는 서예선생 현천(玄川)이 지어준 내 호(號)이고, 그림 역시 그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장난끼 섞어 끄적거려준 소나무에 절하는[拜松] 그림이다.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티웨이항공, 4월 29일부터 ‘인천~자카르타’ 하늘 길 주 5회 연다](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티웨이항공-A330-300-항공기-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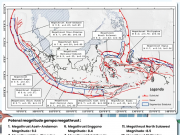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기고문] “아세안 가입한 동티모르…한국과 동반성장 서사 만들길”](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0/최창원-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연구위원-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올림픽] ‘톱10’은 멀어졌지만…한국, 남은 기간 최대 4개 금메달 도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GYH2026012900030004400_P4-100x75.jpg)
![[올림픽] 피겨 이해인 8위 신지아는 11위…여자 컬링 캐나다에 패해 준결승행 무산](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이해인이-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여자-싱글-프리-스케이팅에-출전-연기를-펼치고-있다.-2026.2.20-100x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