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주 교포시인 채인숙 첫 시집 ‘여름 가고 여름’ 나와
[문학뉴스=백승 기자] 지난 1999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교포 채인숙 시인의 첫 시집 <여름 가고 여름>이 민음의 시로 나왔다.
2015년 오장환 신인문학상에 「1945, 그리운 바타비아」 외 5편의 시가 당선되며 시작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30여 년간 이국의 땅에서 고립된 시를 써왔다라고 말한다. 즉 그녀를 달래 준 것은 시에 대한 추억과 시를 향한 열망이었다.
시집을 펼치면 독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시 「디엥고원」은 “열대에 찬 바람이 분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문장은 순식간에 우리를 한 계절이 되풀이되는 열대의 섬나라로 이동시킨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는 내면을 품은 사람들은 바깥을 에워싼 지독한 ‘한결같음’을 어떻게 견딜까.
그때 시인의 눈에 들어오는 건 “가장 단순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땅의 뜨거움과/ 하늘의 차가움을 견디”기 위해 화산재를 밟으며 사라진 사원을 오르는 여자들.
더 바라지 않는 경지만이 다다를 수 있는 초월의 상태 속에서 인내와 정화의 상징이자 지금은 잃어버린 재의 서사가 무심코 일어선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수한 바람 같고 한결같다. 표제가 된 시 ‘여름 가고 여름’도 그렇다.
꽃은 제 심장을 어디에 감추어 두고 지려나
여름 가고 여름 온다
-「여름 가고 여름」에서
아홉 개의 힌두사원이 있는 산길을
신의 등허리를 타고 오른다
나를 놓치지 말아다오
사람들은 외롭지 않겠다고 사원을 지었던 거란다
두려운 것은 신이 아니라 외로움이거든
-「아홉 개의 힌두사원으로 가는 숲」
시집에는 이처럼 이국에서 길어 올린 서사와 감각이 짙게 배어 있다. 아잔 소리가 없어도 시간을 맞춰 기도를 마친 소년, 화산재를 밟으며 사라진 사원을 오르는 맨발의 여자들, 부기스의 마지막 해적이 되어 마카사르 항구를 떠난 열아홉 청년, 씨앗 무늬 사롱을 걸친 맨발의 남자, 자와어를 쓰는 이웃집 할머니 등등.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과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항구를 가진 나라에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경건하고 소박한 삶이 시가 되는 순간들을 발견한다.
그녀의 주된 시적 공간은 데뷔작 「1945, 그리운 바타비아」에도 드러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배경으로 쓴 시인 작품은 이국적인 풍경 안에서 식민지라는 공적 기억과 사랑이라는 사적 기억이 섞이며 만들어 내는 독창적인 정조가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모습으로 재현된다.
소리를 죽여 혼자 우는 자바의 물소나 깜보자 꽃송이, 자바의 검은 돌계단 같은 이방인들의 단어도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된다.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는 노래는 낯설지만 시의 주된 공간이 갖는 특수성은 공통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보편성을 획득한다.
시집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왕복운동에 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밤이 오고 밤이 갔다”거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갔다”는 식, 또는 “파도가 가고 파도가 온다”와 같은 왕복운동에는 떠나는 행위와 돌아오는 행위의 반복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움은 이토록 오고 가는 동사의 모습을 취한다. 시는 병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리움을 달래는 치유의 기록이기도 하다. 속절없이 여름이 반복되는 계절과 무관하게 내면은 덜컹거리며 오고갈 때 “습기의 무기”가 무거워지면 마음엔 스콜처럼 시가 쏟아졌다.
시집의 후반부는 시로 안부를 전하고 시로 안부를 물었던 시간들에 대한 회상으로 가득하다. 이상한 식물과 수상한 동물들의 나라에서 출발한 시원적 그리움이 열대에 부는 찬바람에 섞여 독자에게 날아든다.
이번 채인숙 시인의 첫 시집은 그의 온 생애와 함께한 시에 대한 고백이자 “8000일을 한 계절 속에서” 살고 있는 열대의 시간 속에 남겨진 “병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문단 안팎의 한결같은 평가다.
출처 : 문학뉴스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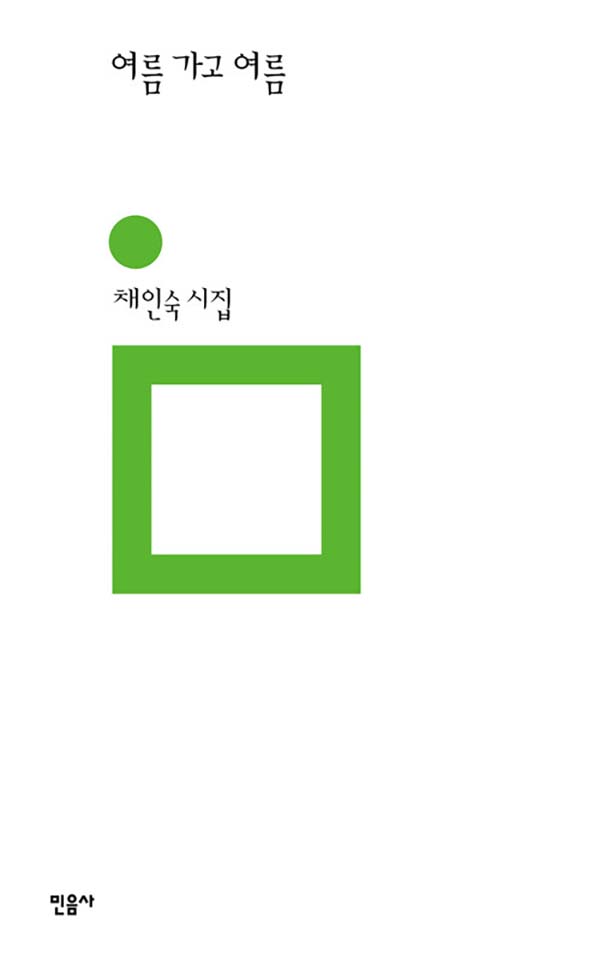



![[특파원 시선] 부풀려진 한국 vs 동남아 누리꾼 간 ‘온라인 설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동남아인들이-집단으로-한국인을-비난하는-모습을-연출한-합성-이미지-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