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1일
글. 이율리.시인.자카르타 거주
핸드백도 구두도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못쓰게 될 때 까지 들고 다니고 신고 다니는 나,
겉 멋을 부릴 줄 모르던 나,
머리 손질도 잘 할 줄 몰라, 늘 생머리를 찰랑거리고 다니고
뒤로 질끈 묶어버리고 다녔던 나..
지금도 여전히 드라이로 웨이브를 주어 멋을 내는 것은
많이 서툴다.
그림도 좀 그리고 글도 끄적거리면서도
도대체 머리 다듬어 멋내는 재주가 없다.
촌스런 내게 딱 맞는 것을 만났으니…
수 년 전, 고향집에 갔다가 어머니 팔짱을 끼고 시내 재래시장 구경에 나섰다.
어릴적 보았던 풍경들이 아스라히 추억 속 창고에서
수 십 년전의 풍경 속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에 충분한 고무신 한켤레
내 눈 안으로 쏘옥 들어왔다.
이쁜 구두들을 제쳐놓고 나는 투박한 고무신을 꺼내어 냉큼 신어보았다.
뒷 면을 살펴보니 영락없이 ‘;메이드인 차이나’;…
좀 아쉽기는 했지만 내 사는 나라에 갖고 가서 집주변을 잘란잘란(산책) 할 때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덥석사서 여행가방에 넣어 비행기 태워 왔다.
고무신 하면 60년대 초, 중반 이저녜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란 우리 또래들은 어릴적 모두 신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내 기억 속엔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 유리같은 빨간 고무신의
추억이 남아있다.
폭우가 쏟아져 여름 장마비가 얕으막하던 냇가에 엄청난 수위로 출렁이며 바다로 흘러가던 날,
난 그만 벗겨진 빨간고무신을 그 장맛비에 빼앗기고 말았다.
아들 넷에 딸 하나인 나를 이뻐하시던 아버진 그 다음 장날에 더 이쁜 고무신을 사다주셨지만
지금도 사나운 흙탕물 위에서 너울너울 거리며 떠내려가던 그 빨간고무신이 눈에 어리곤 한다.
그 이후 오래지않아 운동화도 신고 명절엔 서울 사는 사촌 언니가 사다주신 구두도 신게 되었다.
고무신 하면 떠오르는 선명한 그림이 있다. 언제나 사철 바쁘신 어머니께서ㅡ
맑은 물 속, 가제가 노니는 집 앞 냇가에서 돌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하얗게 닦아놓아 햇볕드는
토방에 세워둔 아버지의 고무신, 그리고 어머니의 하얀 코가 오똑한 이쁜 여자 고무신…
지금도 정답고 푸근한 기억속 풍경이다.
가끔씩 자전거를 탈 때
가끔씩 집 근처를 산책할 때
나는 고무신을 신는다.
까치발을 들고 걷는 것 같은 하이힐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발끝을 통해 감지된다.
고무신 고무신 검정 고무신…
마치 고무줄을 하듯이 폴짝 하늘 높이 뛰어올라도 편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40여년도 더 지난 세월 후에
내가 사온건
보랏빛 퓨전? 고무신이다.
별꽃/ 시로 차리는 아침밥상(16)중에서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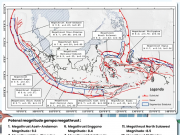
![[골프] 태국 자라비 분찬트, 2026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역전 우승… 한국 김서윤2 공동 2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짜라위-분짠태국이-인도네시아-여자오픈총상금-60만달러에서-우승컵을-차지했다.-2026.2.1-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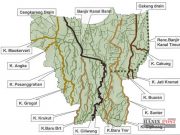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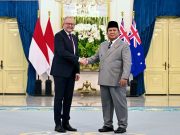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기고문] “아세안 가입한 동티모르…한국과 동반성장 서사 만들길”](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0/최창원-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연구위원-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