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한국 군내 다문화 장병의 문화와 언어, 식습관을 존중해야 군의 단결력과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인찬 육군대학 교관과 박상혁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 등은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동 집필해 학술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9일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미성년자 중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중이 2019년 3.4%에서 2040년 11.7%로 늘어나고, 2025년에 입대하는 다문화 가정의 장병은 8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군은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으로 초래될 안보 공백에 대비해 2010년 병역법을 개정,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입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복무하는 다문화 가정 장병은 총 1만5천명, 2030년에는 군 전체 병력의 5%를 차지할 것으로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전망했다.
다문화 장병의 비중이 늘어나지만, 이들과 관련한 복무규정은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다문화 장병을 ‘차별’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단편적 지침뿐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논문은 종교와 인종 등이 다르게 구성된 ‘다문화 군대’의 성공적 사례로 미군과 고대 페르시아군을꼽았다.
이들 군은 종교와 언어, 민족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해 전투력이 높은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페르시아군의 경우 장병의 취향에 따라 식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미군도 모두 24종의 전투식량에 무슬림용, 유대교용, 채식주의자용 등으로 나눠 다문화 장병의 식습관을 존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통일된 식단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지만 신성시 또는 금기시한 식재료가 들어간 식단은 자칫 식사 거부로 이어져 사기 저하와 전투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소할 수도 있지만, 식문화 존중하는 것이 전투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인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은 다문화 출신 용병들의 종교와 민족,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해 이른바 ‘세포이 항쟁’을 초래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논문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창 시절 외모 차이와 미숙한 언어 탓에 차별을 겪거나 심지어 학업을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다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한 채 차별적 요소가 돼 다문화 출신 장병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다문화 강군으로 부상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해 단결된 조직으로 단일화한 가치관, 대적관으로 무장해야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군 조직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문화 병사가 군 복무를 어떻게 적응해가는지 일련의 병영생활 과정을 범주화하는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c) 연합뉴스 협약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건강] 간학회 이사장의 쓴소리 “돈벌이 알부민 먹느니 계란 사 드세요”](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3/알부민-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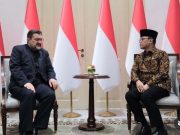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