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동포’는 한배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한서>의 ‘동방삭전’에 처음 보이는데, 주석에 “친형제를 말한다”라고 했다. 한배에서 안 나와도 친한 사이를 형제에 비유하곤 한다. 공자의 제자 자하는 말했다. “군자가 공손하고 예의바르면 천하 사람이 모두 형제다.” 여기서 군자는 완벽한 인격자라는 도덕적 의미보다 사회 지배층이라는 계급적 의미가 강하다. ‘천하 사람’ 범주에 일반 백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자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군자뿐이다.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과 백성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었다.
계급적 한계를 탈피하여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관념은 송대(宋代)에 나타났다. 북송의 성리학자 장재(張載)는 <서명(西銘)>에서 “백성은 나의 동포(民吾同胞)”라고 천명했다. 미천한 백성이 형제라니, 혁명적인 발언이었다. 이후의 성리학자들은 장재의 발언을 긍정하면서도, 혈연과 친소를 탈피한 차별 없는 사랑, 즉 묵가(墨家)의 겸애(兼愛)와 혼동할 위험을 경계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사회와 국가로 확장하는 유교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주희(朱熹)는 장재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하늘과 땅이 부모와 같다고 해서 친부모를 버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백성이 나의 동포라지만 친형제와는 다르다.”(<주자어류>) 백성이 형제라는 말은 비유에 불과했다. 백성은 여전히 통치 대상에 불과했다.
근대에 이르러 신분제가 무너지자 동포는 비로소 계급을 초월했다. 대신 피로 맺어진 같은 민족에게만 동포 자격이 주어졌다. 보편적 인류애 관점에선 후퇴다. 당시 세계를 휩쓴 민족주의 영향이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제에 저항하려면 ‘이천만 동포’의 단결이 필요했다.
오늘날 동포의 의미는 더욱 좁아져 해외 한인을 가리킨다. 재외동포법에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외국 국적자와 그의 직계 비속”이다. 직계 비속의 대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계 외국인은 거의 다 동포에 속한다. 앞으로 태어날 한국계 외국인 역시 자동으로 동포 자격이 주어진다. 그들의 정체성과는 관계없다. 오직 혈연이 기준이다.
혈연에 바탕을 둔 민족 관념이 희박해져인지, 오늘날 한국인은 동포의 성취에 예전처럼 열광하지 않는다. 언론이 한국계 외국인의 성취를 주목해도 호들갑이라 여길 뿐이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하지만 격동의 시기에 자의 반 타의 반 해외로 이주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무시한 채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선을 긋기도 곤란하다. 동포라는 관념은 세계화 시대, 한반도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한국인의 범주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면도 있다.
국민과 동포는 다르며,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도 다르다. 따라서 동포 자격 부여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동포라는 관념이 한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 이민자와 같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할 위험은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오늘날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것은 혈연이 아니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다. 협소한 동포 관념을 벗어날 때다.
<경향신문>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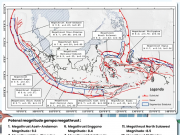
![[골프] 태국 자라비 분찬트, 2026 인도네시아 여자 오픈 역전 우승… 한국 김서윤2 공동 2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짜라위-분짠태국이-인도네시아-여자오픈총상금-60만달러에서-우승컵을-차지했다.-2026.2.1-180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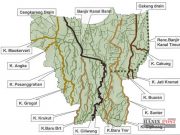



















![[연예] 엑소, 2026년 월드 투어 ‘엑소리즌’ 대장정 돌입… 6월 자카르타 입성](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2/월드-투어-콘서트-‘EXO-PLANET-6-–-EXhOrizon엑소-플래닛-6-엑소리즌-180x135.jpg)




![[기고문] “아세안 가입한 동티모르…한국과 동반성장 서사 만들길”](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0/최창원-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원-연구위원-238x178.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