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5~0.75%로 올린 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1년 동안 단 한 차례 0.25%포인트만 올린 연준의 느린 걸음에 시장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연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내년 금리 인상이)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세 차례 정도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 인상에 그칠 거라는 비둘기파의 관점을 따르더라도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의 한국 금리(1.25%)와 같아진다.
1년 전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7년 동안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이제 미국 실업률(4.6%)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투자 확대로 미국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이르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 유럽과 일본도 마냥 거꾸로 갈 수만은 없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출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멕시코와 터키 같은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을 막으려 금리를 올렸다. 중국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초저금리와 유동성 홍수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이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를 글로벌 시장에 활짝 열어 놓은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던진 화급한 숙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내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급선무다. 외국인이 들고 있는 국내 상장 채권은 작년 6월 106조원에 이르렀다. 지금은 89조원에 그친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한국 국채보다 높아졌다. 원화 가치 하락도 한국 채권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신흥국 위기가 재연되면 외국인들에게 현금인출기로 인식되는 한국에서도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외화포지션 한도, 단기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외국인 보유 채권 과세제도를 손질해 자본 유출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 빚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134만 한계가구의 맞춤형 채무 조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들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웃돌아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가계빚이 14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당장 10조원 안팎의 이자 부담이 더 생긴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실 위험이 특히 심각하다. 1·2금융권이 함께 원리금 상환 방식과 이율, 기간을 조정하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셋째, 장사를 해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지금 전체 기업 7곳 중 1곳은 3년 내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금리 상승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매일경제>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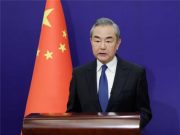































 카톡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